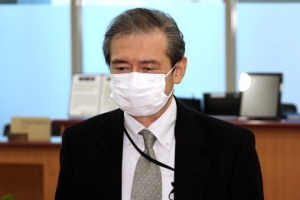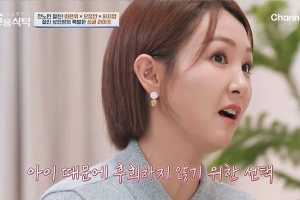송영민씨 주도 한·미연구진 네이처 주요 논문으로 실려


송영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신소재공학부 박사
한국인 과학자가 주도한 한·미 공동연구진이 가슴 성형 보형물로 사용되는 실리콘으로 곤충의 눈을 재현, 160도 이상의 시야를 가진 디지털 카메라 렌즈를 개발했다. ‘디지털 카메라의 혁명’으로 주목받고 있다.
송영민 미국 일리노이주립대 신소재공학부 박사는 1일 “곤충의 겹눈 구조를 모방, 잡아당기면 늘어나는 형태의 이미지 센서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연구결과는 세계적 과학저널 ‘네이처’ 2일자에 주요 논문으로 실렸다.
현재의 디지털 카메라는 렌즈 1개에 이미지 센서 1개가 연결돼 있다. 렌즈가 포착한 화상이 이미지 센서로 전달되면 이미지 센서는 이를 전기 신호로 바꿔 사람이 볼 수 있는 영상으로 재구성한다. 연구팀은 렌즈와 이미지 센서를 모두 늘어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실리콘 위에 작은 렌즈 180개를 붙인 뒤 실리콘을 반구 형태로 만들어 각각의 렌즈를 이미지 센서와 연결되게 했다. 여러 개의 홑눈이 모인 곤충의 겹눈과 같은 구조로 작은 렌즈 하나가 곤충의 홑눈 하나에 해당한다.
송 박사는 “곤충의 눈은 카메라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꿈이었지만, 평평하고 딱딱한 이미지 센서로는 구현할 수 없었다”면서 “늘어나는 소재를 사용해 이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 카메라는 180개의 렌즈가 얻은 정보를 종합해 디지털로 만들기 때문에 가장자리가 번지거나 원근 구별이 어려운 기존의 광각 렌즈와 달리 이미지 왜곡이 없고 거리와 상관없이 선명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연구팀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군사, 의료, 보안 등 다양한 곳에 쓰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을 비행하며 최대한 넓은 지역을 정찰해야 하는 무인 비행 로봇 개발에 대한 기대가 높다.
연구에 참여한 정인화 경희대 기계공학과 교수는 “곤충 눈을 모방한 렌즈는 무게가 가벼워 탑재가 쉽고, 카메라 방향을 틀어주는 장치가 없어도 넓은 면적의 관찰이 가능해 부피 및 부품수를 줄일 수 있다”면서 “폐쇄회로(CC)TV에 사용하면 별도 부품 없이 렌즈만으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박건형 기자 kitsc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