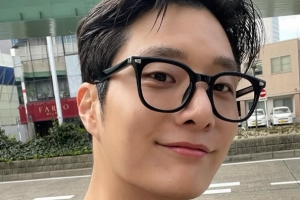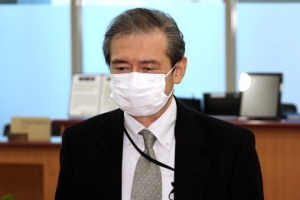글 김주영 그림 최석운
“한 가지 수상한 것은 있습니다. 저들이 장례를 치러주지도 않을 것인데, 어째서 시신을 거두어갔는지 그리고 원상과 차인꾼을 분별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텐데 어찌 원상들은 욕보이지 않고 차인꾼들만 죽이고 또 협박하여 소굴로 데려갔을까요. 그 내막을 짐작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시신을 가차없이 버리고 갔을 터인데요.”

“원상을 욕보이면, 필경 임소 전체가 들고일어나 보복이 돌아올 수도 있을 것이고, 차인꾼을 둔소로 데려가면 고분고분해서 저들과 짝패되기 십상이라는 생각을 가졌겠지. 아니면 세작이나 척후로 써먹을 속내가 있었던지. 그리고 가근방 내왕길 지리에 밝은 사람이 필요했을 테지. 시신을 거두어간 것은 부상들이 통문을 돌려 도회를 열고, 장례를 시작으로 하여 임소의 부상들이 결속을 다지고 둔소를 소탕하려는 계기로 삼을까 걱정해서일 것이오. 그들 소굴에 책사도 있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이 그럴듯하군.”
“아서, 그게 아닐 수도 있네. 일면식도 없는 도둑의 속내를 앉아 있던 우리가 어찌 알겠나. 함부로 예단하는 게 아닐세.”
“그 말도 일리가 있군.”
“어허, 그놈들 귀신 잡아먹고 도깨비 똥 눌 놈들이로군.”
“그런데 행수님은 왜 말씀이 없습니까.”
“……“
좌중의 시선이 지금까지 말 한마디 없었던 도감 정한조에게 쏠려 있었다. 그러나 그는 끝내 꿀 먹은 벙어리였다. 어떤 속내를 가지고 있는지 짐작하기 어려웠다. 한마디하라고 짓조르고 드는 것을 생트집으로만 알아서 정한조는 입도 뻥긋하지 않았다. 좌중은 물을 끼얹은 것처럼 가라앉았다. 침묵의 시간이 흘러갔고 고단했던 일행들은 새벽잠으로 곯아떨어졌다. 이튿날 깨어보니 정한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다. 그는 한숨도 자지 않고 곽개천을 밖으로 조용히 불러내어 먼저 말래 도방으로 가겠다고 통기하고 한밤중에 겁도 없이 단신으로 말래로 떠난 것이었다. 야밤에 혼자서 십이령을 넘는다는 것은 여간한 간담이 아니었다. 화적은 고사하고 짐승의 밥이 되기 꼭 알맞았다. 곽개천이 동행하겠다고 하였으나 끝끝내 내치며 듣지 않았다. 도대체 이렇게 서두르는 까닭이 어디 있느냐고 아득바득 따지고 들었으나 천근 같은 입을 열지 않았다.
개호주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리는 음산한 밤중에 내성을 발행한 그는 열불나게 길을 줄이기 시작했다. 끼니를 꼬박 굶은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산짐승과 동행도 해가면서 이틀 만에 샛재 비석거리에 당도하였다. 불각시에 모습을 드러낸 그는 화들짝 놀라 눈을 하얗게 뜨는 월천댁에게 물어보았으나 자취를 감추었다는 포병객이 찾아왔었다는 귀띔은 없었다. 당장은 실망스러웠으나, 열 일을 제쳐두고 그 위인의 행방을 쫓아야 했다. 근자에 일어난 수상쩍은 사태와 적변의 시단이 모두 궐자의 행적과 상당한 관계를 가졌다는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저러한 사정을 알아챌 리 없는 월천댁은 딴청을 피웠다. 봉당 쪽마루에 걸터앉아 초연히 먼산바라기를 하는 정한조에게 바싹 다가앉으며 월천댁이 말문을 열었다.
“우리 구월이 말이요.”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더니, 기운도 탈진해서 눈앞에 보이는 것이 모두 희미한 사람에게 또 무슨 넋두리를 하려고?”
월천댁은 정주간 안쪽에 있는 골방을 턱짓으로 가리키며 제법 침통한 표정으로,
“글쎄, 도감 어른도 아시다시피 저년이 이팔방년이 내일모레 아닙니까.”
“그건 나도 알고 있소.”
“간혹 봉노 앞을 지나다니는 도감 어른 수하 중에 한 사람을 보니까. 허우대도 튼실하고 붙임성도 있어 보입디다. 성깔도 녹록지 않아 보이던데. 새앙머리한 처자 나이 이팔이라면 명치끝까지 차오른 게지요. 그래서 이 에미에게는 저 꼴같잖은 소생이 노상 끌탕이랍니다. 숫막이라는 것이 길가에 나와 앉은 하찮은 거처가 아닙니까. 삽짝도 없어 문만 벌컥 열면 바로 안방이지요. 어느 떠돌이 비렁뱅이가 한밤중에 칼 물고 들이닥쳐 저년 앙가슴 내질러 자빠뜨리고, 자던 입에 콩가루 털어넣듯 막무가내로 육허기나 채우고 튀어버릴까 해서 자다가도 문득 깨어나면 가슴이 두근거려 두 번 다시 잠을 청할 수가 없습니다. 그로써 절개가 이지러지고 나면, 갈 곳은 대처의 색주가뿐이지요. 그런 오욕을 당하면 색주가에서 살꽃이나 파는 처량한 신세밖에 될 게 없습니다.”
2013-05-22 2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