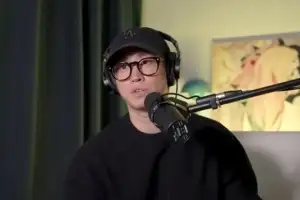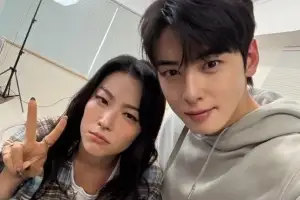숙수사터 출토 금동약사여래입상

숙수사터 당간지주
당시 학교측은 학생을 동원해 불상들을 발굴했다고 한다. 당시 문화재 관리 주무부처였던 문교부는 국립중앙박물관에 현지조사와 동시에 유물을 인수하는 임무를 맡겼다. 이듬해 3월 김원룡 당시 중앙박물관 학예연구관이 현장에 파견됐다.

숙수사터 출토 금동약사여래입상

숙수사터 금동여래좌상
통일신라시대 이후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 대형 토기의 존재는 불상이 묻힌 시기를 짐작케 해준다. 당시 김원룡 연구관도 불상은 고의로 매몰한 것 같고, 따라서 스님들이 전란을 피하여 불상을 파묻고 사찰을 비운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의견을 내놓았다.
소수서원은 풍기군수 주세붕(1495~1554)이 풍기군수로 부임하여 순흥 출신의 유학자 안향(1243~1306)을 모시는 사묘(祠廟)를 세우고 신비들이 공부하는 장소로 삼았다가 중종 38년(1543) 백운동서원을 설립한 것이 시초라고 한다.

수소서원 전경
김재원 박사는 고려시대 몽골의 침입과 연관지었다. 당시 대구 부인사 대장경과 경주 황룡사 9층탑에 불탔다. 특히 고종 41년(1254) 자랄타이가 대군을 이끌고 몰려왔을 때는 사로잡힌 사람이 20만명에 사망자는 헤아릴 수 없었다. 숙수사도 이 때 불타고, 스님들도 모두 죽거나 잡혀가 훗날 불상을 수습할 사람조차 없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서동철 수석논설위원 dcsuh@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