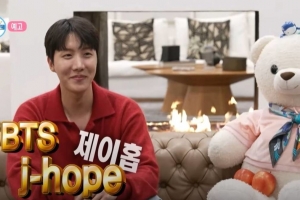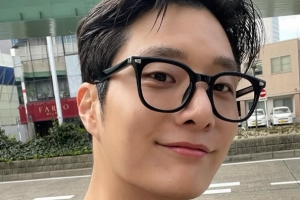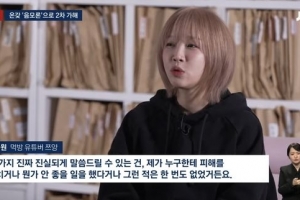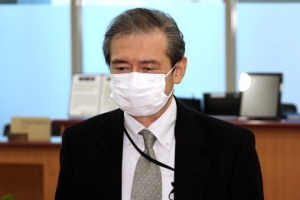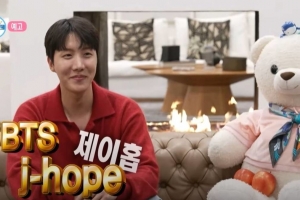하지현 건국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
한편 정상의 범위는 타인의 움직임을 보면서도 익힌다. ‘부산행’, ‘킹덤’, ‘지금 우리 학교는’ 모두 K좀비물이다. 좀비를 아무도 본 적 없지만 딱 보면 좀비인 걸 안다. 좀비의 시그니처는 관절의 괴상한 동작이다. 저렇게 꺾이면 아파서 데굴데굴 구르거나 죽어야 하는데 좀비는 살아 있는 듯 사람을 쫓는다. 언캐니한 순간이라 섬뜩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어느 이상으로 관절이 예상 밖 범위로 움직이는 것은 보는 사람도 불안하게 만든다. 그런데 유연성은 몸의 움직임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유연함이란 상황에 따라 내 판단을 적절히 바꾸어 대응하는 것과 표현의 가변성에도 쓰인다. 일반적으로는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게 잘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선 융통성이 떨어지고 고지식하다고 탓한다. 하지만 몸이 그렇듯 생각이나 표현의 유연성도 지나치면 문제가 된다.
요새 대선후보들의 공약이나 발언을 보면 무척 헷갈린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여기서 하는 말과 저기 가서 하는 말에 원칙이 없다. 저 진영에서 할 말이 아닌 것 같은 것도 쉽게 한다. 관절로 치면 여기서 멈춰야 할 것 같은데 그 한계를 넘어가 버린 셈이다. 좋게 보면 유연한 정치적 스탠스지만 보는 사람은 곤혹스럽고 불안을 느낀다. 당선을 위해선 뭐든 말하고 보는 포퓰리즘이란 말이 나온다. 정치란 유연함을 필요로 하지만 리더에겐 일관성과 원칙이 더 중요할 수 있다. 그래야 기대하고 예측하며 신뢰할 수 있다. 어느 후보건 지지를 하는 마음 뒤에 불안이 담겨 있는 이유는 여기서 온 것 같다. 오랫동안 뻣뻣하다는 평을 받던 후보의 지지가 반등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여기까지 생각이 오고 나니 한심하던 내 뻣뻣한 관절이 꽤 괜찮게 느껴졌다. 자기합리화의 끝판왕이다.
2022-02-08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