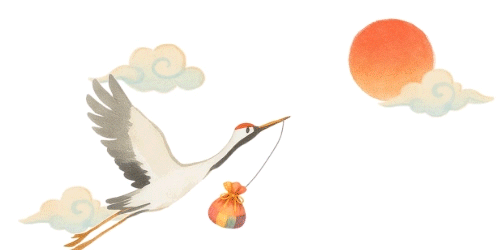임병선 체육부장
그러나 CNN이 퍼거슨의 이름값에만 도취됐을까? 아니라고 본다. 그의 존재감은 이미 피치(‘그라운드’의 영국식 표현)를 벗어나 있다. 다른 분야에서도 본받아야 할 스포츠 리더십에 대한 열광과 환대, 그 의미를 간파한 결과가 아닐까.
오는 20일 0시 호손 스타디움에서 킥오프하는 웨스트브로미치와의 2012~13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최종전이 끝나면 ‘퍼기 영감’의 불그스레한 얼굴, 한 경기를 치를 때마다 껌 10개씩을 씹어대는 그의 입 근육 움직임을 더 이상 피치에서는 바라볼 수 없게 된다.
한 팀에서만 27년을 사령탑으로 지낸다는 것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의 망으로 얽힌 21세기에 가당키나 한 일일까. 그 숱한 도전과 깎아내리기를 어떻게 견뎌냈을까.
‘헤어드라이어’로 대표되는 온갖 부정적인 별칭들을 거느린 퍼거슨이 진정한 명장으로 각인되고 조명되는 것은 팀의 작동 원리를 진정으로 이해했기 때문일 것이다. 팬들의 응원 열기나 심판 판정에 대한 항의의 몸짓 하나까지 치밀하게 계산해 내고 이를 팀의 전술, 나아가 구단의 마케팅 전략에까지 연결할 줄 아는 능력 덕도 있을 것이다.
최근 들어 스포츠 리더십이 상대적으로 더 주목받고 귀한 대접을 받고 있다. 미국 대학농구의 전설 존 우든(1910~2010년)이 첫걸음을 뗐다. 가깝게는 거스 히딩크 전 대표팀 축구 감독이나 퍼거슨 감독이 박지성을 세계적인 선수로 길러낸 ‘구루’(영적인 스승)의 존재값으로 국내 팬들의 머릿속에 매겨졌다.
그 요체는 다른 분야의 지도자들에게서 쉽게 찾기 힘든 수평적 리더십이 아닐까.
올해 만 72세인 그가 20대 초반 선수들에게도 천진난만한 미소를 날리는 모습은 여느 사령탑이 쉽사리 본뜨기 힘든 덕목이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의문. 우리는 왜 그와 같은 지도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가? 여러 종목에서 근접하는 이름들을 되뇔 수 있지만 이름 석 자를 크게 외칠 수 있는 이는 적다. 체육계만이 아니다. 정치권이나 재계를 봐도 큰 그림자를 확인하기 어렵다. 수평적인 소통이 강조되는 시대라 그렇다고 변명하기엔 멋쩍은 일이다.
더 근본적으로 되새길 일은 우리 스스로 그런 지도자를 키워내지 못할 정도로 협량한 사회를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자책이다. 퍼거슨이란 명장도 극성스럽기로 악명 높은 영국 축구팬들이 참고 오랜 시간 어우러져 퍼올린 지혜의 소산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우리의 눈과 귀가 어두워 그런 지도자를 알아채지 못하고 있을까. 좋은 숲에서 좋은 나무가 자란다. 먼 나라의 명장을 떠나 보내는 이들에 대해 시샘을 느낀다면 그 단순한 교훈부터 되새길 일이다.
bsnim@seoul.co.kr
2013-05-10 3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