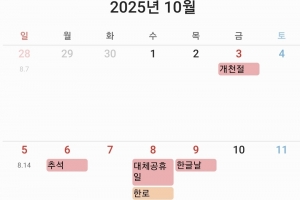부동층州 ‘빅3’ 중 결정적 캐스팅보트
미국에는 “오하이오가 가면, 미국이 간다.”는 말이 있다. 50개 주 가운데 오하이오의 표심이 대선 승패에 가장 결정적 역할을 하는 데서 온 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 대선에서 오하이오를 빼앗기고도 당선된 대통령은 민주당의 존 F 케네디가 유일하다.그렇다면 왜 선거인단 규모(18명)로 7위에 불과한 오하이오가 대선 때마다 결정적 캐스팅보트를 쥐는 것일까.
신기하게도 50개 주 가운데 민주당 성향과 공화당 성향이 짙은 주부터 차곡차곡 계산해 나가면 마지막에 오하이오가 승부처로 남는 것을 알 수 있다. 예컨대 텍사스(38명) 등 보수색이 짙은 주는 무조건 공화당 차지이고, 캘리포니아(55명) 같은 곳은 늘 민주당 몫이다. 이런 주들로부터 시작해 양당 후보별 우세한 주들을 분류하다 보면 대체로 10개 안팎의 부동층주(스윙 스테이트)가 남는다. 올해 대선의 경우 현 판세에 비춰볼 때 9개주가 스윙 스테이트로 분류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현재 오바마는 민주당 성향의 19개 주 등에서 우세를 보여 237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하고 있는 반면 롬니는 공화당 성향의 23개 주에서 앞서 191명의 선거인단을 수중에 품었다. 결국 전체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과반인 270명을 확보하려면 오바마는 33명, 롬니는 79명 이상의 선거인단을 스윙 스테이트에서 더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민주당 후보가 뚜렷이 앞서고 있을 경우 승리는 손쉽다. 스윙 스테이트 ‘빅3’인 플로리다(29명), 노스캐롤라이나(15명), 오하이오 가운데 두 곳에서만 이기면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늘 선거는 막판에 가면 박빙의 승부가 펼쳐지게 마련이다. 공화당 후보가 격차를 좁힐 경우 제일 먼저 넘어가는 곳은 대체로 플로리다, 노스캐롤라이나, 버지니아(13명) 등이며, 이어 콜로라도(9명), 뉴햄프셔(4명), 네바다(6명) 등이 비슷한 속도로 움직인다. 그 다음 마지막 단계에 오하이오, 아이오와(6명), 위스콘신(10명) 순으로 ‘함락’된다. 이런 메커니즘에 입각해 계산해 보면 스윙 스테이트에서 33명의 선거인단을 확보해야 하는 민주당 후보와 79명을 확보해야 하는 공화당 후보가 만나는 전선이 오하이오가 된다. 오하이오는 또 인종별, 계층별 인구분포가 가장 중립적인 주로 꼽힌다. 그렇기 때문에 오하이오를 차지할 정도면 전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다.
데이턴(오하이오주)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
2012-10-25 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