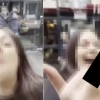김가경 작가
“네, 듣고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그 길로 가겠다는 말인지 아닌지 애매해 다시 설명했다. 그래도 그는 손님 알겠습니다,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 무언가 진행 중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목적지로 가겠다는 의지를 읽지 못한 나는 아시겠느냐는 말을 몇 차례나 더 물었다. 그는 듣고 있다는 대답만 반복했다. 심리적 노선에 대한 확답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목적지의 중간쯤 왔을 때였다. 그가 왜 길을 둘러 가느냐고 뒤늦게 물었다. 나는 ‘불안해서요’라는 말을 할 수 없어 ‘빛이 밝아서요’라고 대답해 버렸다. 여러 속내가 뒤섞인 그 말을 알 리 없는 그가 부두길이 더 빠른데, 라며 말을 흘렸다. 나는 심리적 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횡단보도를 건너기 싫어서 그렇다고 궁색한 변명을 했다. 명확하지 않아도 그건 사실이었다. 그가 납득을 하지 못하는 것 같았다. 소설을 쓸 때보다 더 집중해서 새벽에 횡단보도를 건너기 싫은 이유를 찾아댔다. 어느새 갈림길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손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내 이야기를 듣던 그가 속도를 늦추며 말했다. 도대체 뭐가 안 되겠다는 말인지 모를 일이었다.
“양심상 그 길은 안 되겠습니다. 둘러도 한참을 둘러가는 길인 줄 제가 아는데.”
수년간 우회도로를 다녔어도 그런 양심고백은 처음 들었다. 그가 반복한 ‘듣고 있다’는 말에 담긴 내적 갈등을 뒤늦게 알아챘다. 그는 둘러댄 내 이야기를 순수하게 종합해, 기어이 부두를 지나,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길로 접어들어 집 앞 골목에 차를 대주었다.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아도 될 거리를 빠르게 찾은 것이다. 빛이 밝은 곳은 따로 있었다. 나는 선뜻 내리지 못하고 때 이른 새해맞이 인사를 건넸다. 그의 축복이 이내 되돌아 왔다.
“손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2-01-1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