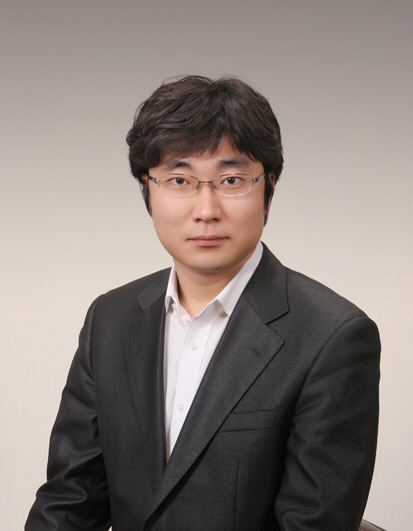
ВЮ┤ВўЂВцђ ВѓгьџївХђ ЖИ░Въљ
ьЋавеИвІѕвЊцВЌљЖ▓ї РђюВё▒вЁИВўѕвЮ╝віћ вДљВЮё Вќ┤вќ╗Ж▓ї ВЃЮЖ░ЂьЋўвіљвЃљ.РђЮЖ│а вг╗віћ Ж▓Ѓ ВъљВ▓┤Ж░ђ вՐ‸вЪгВЏавІц. ЖиђЖ░ђ Вќ┤вЉљВџ┤ ьЋавеИвІѕвЊцВЌљЖ▓ї РђўВюёВЋѕвХђРђЎ, РђўВё▒вЁИВўѕРђЎвЮ╝Ж│а ВЊ┤ ВбЁВЮ┤вЦ╝ в│┤ВЌг ВБ╝вЕ░ РђюВаЂвІ╣ьЋю вДљВЮё Ж│евЮ╝ вІгвЮ╝.РђЮЖ│а В▓ГьЋўвацвІѕ вДїЖ░љВЮ┤ ЖхљВ░еьќѕЖ│а, вѓюЖ░љьќѕвІц.
ЖиИвъгвІц. РђўВё▒вЁИВўѕРђЎ вфЁВ╣Г вЁ╝въђВЮђ ьЋавеИвІѕвЊцВЌљЖ▓ївіћ вХђВ░еВаЂВЮИ вгИВаюВЮ╝ в┐љВЮ┤ВЌѕвІц. 80вїђ ВцЉв░ўВЮё вёўВќ┤ ВЃЮВЋаВЮў вДЅв░ћВДђВЌљ вІцвІцвЦИ ьЋавеИвІѕвЊцВЮђ РђўВЮ╝в│ИВЮў ВѓгЖ│╝РђЎвДїВЮё в░ћвъљвІц. ЖиИвЪгвЕ┤ ВџЕВёюьЋўЖ▓авІцЖ│а ьќѕвІц. РђюВё▒вЁИВўѕвЃљ, ВюёВЋѕвХђвЃљ.РђЮВЮў вЁ╝въђВЮђ ВЮ╝в│ИЖх░ ВюёВЋѕвХђ ьћ╝ьЋ┤Въљ вгИВаю ьЋ┤Ж▓░ВЌљ ВъѕВќ┤ Вќ┤Вёцьћѕ в│ђВБйВЮ╝ в┐љВЮ┤ВЌѕвІц.
ВѓгВІц РђўВё▒вЁИВўѕРђЎвЮ╝віћ вІеВќ┤віћ 1996вЁёвХђьё░ ВюаВЌћВЮИЖХїВюёВЏљьџї вЊ▒ВЌљВёю вЉљвБе ьєхВџЕвЈ╝ ВЎћвІц. вгИВаюВЮў в│ИВДѕВЮё Ж░ђВъЦ Въў вЊювЪгвѓ┤віћ ВџЕВќ┤вАю, ЖхГВаюВаЂВю╝вАю ВЮИВаЋв░ЏЖ│а ВъѕвІц. Ж┤ђвае вІеВ▓┤ВЌљВёювЈё ВѕўвЁё ВаёвХђьё░ ВџЕВќ┤ ВаЋвдгВЮў ьЋёВџћВё▒ВЮё ВаюЖИ░ьќѕвІц. ьЋўВДђвДї ВаЋвХђвіћ ВЎИвЕ┤ьќѕвІц. ЖиИвЪгвІц ВхюЖи╝ ьъљвЪгвдг ьЂ┤вд░ьё┤ в»И ЖхГвг┤ВъЦЖ┤ђВЮ┤ РђўВё▒вЁИВўѕ ВџЕВќ┤ ВѓгВџЕРђЎВЮё ВДђВІюьЋўВъљ ЖиИВаюВЋ╝ ВаЋвХђЖ░ђ РђюЖ▓ђьєаьЋўЖ▓авІц.РђЮЖ│а вѓўВёа Ж▓ЃВЮ┤вІц. ВъљВБ╝ВаЂ ЖхГЖ░ђ, ьћ╝ьЋ┤ЖхГЖ░ђвАюВёю вՐ‸вЪгВџ┤ ВЮ╝ВЮ┤ ВЋёвІљ Вѕў ВЌєвІц.
ВаЋвХђЖ░ђ ЖиИвЈЎВЋѕ ьЋавеИвІѕвЊцВЮў ВџћЖхгвЦ╝ Ж▓йВ▓ГьЋ┤ ВЎћвЇћвЮ╝вЕ┤ ВџЕВќ┤ вгИВаюЖ░ђ в│ИВДѕВЮ┤ ВЋёвІўВЮё ВЋїЖ│авЈё вѓевіћ ВЮ╝ВЮ┤вІц. ЖиИвЪгвѓў вՐ‸вЪйЖ▓ївЈё ВДђЖИѕЖ╣їВДђ ВюёВЋѕвХђ вгИВаю ьЋ┤Ж▓░ВЮё ВюёьЋ┤ ВаЋвХђЖ░ђ ьЋю ВЮ╝ВЮђ ВЋёвг┤Ж▓ЃвЈё ВЌєвІц. ВДђЖИѕВЮ┤вЮ╝вЈё ВаЋвХђвіћ ВюёВЋѕвХђ вгИВаюЖ░ђ ьћ╝ьЋ┤ ьЋавеИвІѕвЊцвДїВЮў вгИВаюЖ░ђ ВЋёвІѕвЮ╝ ЖхГв»╝ВЌљ вїђьЋю ЖхГЖ░ђВЮў В▒Ёвг┤ВЮ┤Въљ ВЮ╝в│ИВЌљ вїђьЋю ВБ╝ЖХїВаЂ ЖХївдгВъёВЮё ВъљЖ░ЂьЋ┤ВЋ╝ ьЋювІц. ВЮ┤Ваю ВЃЮВА┤ ьЋавеИвІѕвіћ Ж│аВъЉ 60ВЌгвфЁ. ВІюЖ░ёВЮ┤ Вќ╝вДѕ вѓеВДђ ВЋіВЋўвІц.
apple@seoul.co.kr
2012-07-17 10вЕ┤
Copyright РЊњ ВёюВџИВІавгИ All rights reserved. вг┤вІе ВаёВъг-Въгв░░ьЈг, AI ьЋЎВіх в░Ј ьЎюВџЕ ЖИѕВДђ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