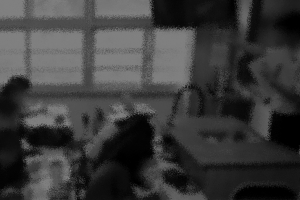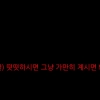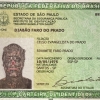뱀도 근처에 얼씬 못하는 1500세 신령스런 나무
생명은 한순간도 정체되지 않고 성장과 소멸을 거듭한다. 사람이든 짐승이든 식물이든 매한가지다. 한 부분이 수굿이 성장하여 죽음을 맞이하면, 그의 뿌리는 또 하나의 새 생명을 일으킨다. 새로 태어나는 세포와 죽어가는 세포가 하나의 몸에 공존한다. 삶과 죽음은 결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삶은 죽음을, 죽음은 삶을 끌어안고 살아가는 게 생명의 원리다. 무릇 모든 생명은 살아 있으면서 동시에 죽어간다. 강인한 생명력을 가진 나무의 경우는 더 그렇다. 줄기가 부러진 뒤에도 나무는 새로 난 줄기로 그의 생명을 이끌어간다. 천년을 살아온 나무에서 태어나던 때의 세포를 찾는 건 그래서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의 나이를 측정하는 것도 언감생심일 수밖에 없다.

삼척 늑구리 은행나무 전경. 줄기가 썩어 문드러진 뒤, 새로 돋아난 맹아지가 긴 세월 동안 생명의 신비를 이어왔다.
강원도 삼척 늑구리 은행나무의 나이는 1500살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다. 그러나 비슷한 연륜의 다른 은행나무에 비해 그리 크지 않다. 중심 줄기가 오래전에 썩어 문드러지고 죽은 줄기 곁에서 촘촘히 돋아난 여러 개의 맹아지(萌芽枝)가 수백 년을 자라서 새로운 모습으로 20m의 높이까지 솟구쳐 올랐다. 새로 태어난 삶이 죽음을 에워싸고 하늘을 우러러 큰 생명을 이룬 것이다.
맹아지는 줄기나 가지에서 불규칙하게 솟아나는 새 가지로 대부분의 나무에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유독 은행나무의 맹아지는 기존의 줄기와 가지 못지않은 크기로 발달하는 특징을 가졌다.
1500년 전에 뿌리를 내린 늑구리 은행나무의 줄기는 죽어 없어졌고, 그 곁에서 새로 돋은 10여개의 크고 작은 맹아지가 우람하게 자랐다. 수백 년은 족히 넘어 보이는 굵은 맹아지에서부터 고작해야 10여년쯤 돼 보이는 가늣한 맹아지까지 다양한 연륜과 크기의 맹아지가 서로 어울렸다. 이처럼 다양한 맹아지들이 하나의 뿌리에서 돋아났다는 것을 믿기 어려울 정도다.
새로 자란 맹아지들은 줄기가 있던 텅 빈 가운데 자리를 촘촘히 메웠다. 자연히 나무 전체의 생김새도 애당초 이 나무와는 전혀 다른 모양으로 여겨진다. 꽤 어지러워 보이는 나무의 생김새는 한 그루가 지어낸 결과가 아님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
거대한 크기의 은행나무가 사람의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산 위에 외따로 서 있다는 것도 이 나무의 특이한 점이다. 은행나무는 저절로 번식하지 않고, 사람의 마을에서 사람의 손을 타고 자라는 나무라는 이유에서다. 나무 곁에서 오래된 사람살이의 자취는 찾을 수 없다. 고작해야 몇십년도 안 돼 보이는 낮은 지붕의 살림채가 하나 있을 뿐이다.
●절집 자리에서 스님들이 심어 키운 나무
“30년 전에 딸아이가 산 아래의 소달초등학교에 들어갔지. 읍내에 살았는데, 학교가 멀어서 아이가 힘들어했어. 그때 마침 이곳에 친척이 살다 떠나려던 집이 있어서, 맞춤하다 싶어 들어와 살게 됐지.”
나무 앞에서 밭을 일구며 살아가는 김명환(70) 노인은 이 외딴 집에서 나무를 바라보며 일곱 남매를 키웠다. 자식들을 모두 대처로 내보내고 지금은 노부부만 남았지만, 김 노인은 ‘신령스러운 나무가 지켜주는 든든한 집’이라며 자랑스러운 미소를 짓는다.
“은행나무가 있는 곳이어서 ‘은행정’이라고 부르는데, 예전에 이 마을을 ‘절골’이라고 불렀대. 나무에 스님들과 관계된 전설이 있다고도 하지만 연유는 몰라. 절골이라면 절이 있었다는 이야긴데, 그런 흔적이 없거든.”
절집의 흔적도 없는 자리에서 1500년을 자란 나무에 얽힌 오래된 전설을 톺아보면, 늑구리 은행나무는 절집 마당에서 스님들이 정성껏 심어 키우던 나무임을 알 수 있다.
예전에 한 동자승이 이 나무 줄기에 기어오르기를 좋아했다. 어린 동자승은 줄기에 기어오르다 떨어져 다치는 일이 잦았다. 동자승을 돌보던 큰스님은 동자승이 아예 나무에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나무줄기를 반들반들하게 깎아내려 했다. 스님이 나무의 몸집에 날카로운 칼을 밀어넣는 순간, 하늘에서 천둥번개가 내리치고 줄기에서는 검붉은 피가 흘러내렸다. 놀란 스님은 법당으로 뛰어들어가 부처님께 용서를 빌었다. 그때 불상에서 “나무의 피를 받아 마셔라.”라는 소리가 흘러나왔고, 스님은 뛰어나와 나무가 흘리는 피를 받아마셨다. 그러자 스님은 창졸간에 커다란 구렁이로 변해서 나무 줄기 가운데에 똬리를 틀고 나무를 지키는 지킴이가 됐다.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변증의 생명체
나무를 신성하게 잘 지키려는 의도에서 지어낸 이야기가 틀림없겠지만, 이야기에 굳이 스님과 동자승을 등장시킨 건 아무래도 이 나무가 절집과 관계 있는 나무임을 보여 주는 증거로 생각된다. 김 노인의 말처럼 절집의 흔적은 없지만 나무는 필경 절집의 나무였던 것이다.
“예전에 개를 키웠던 적이 있어. 그런데 이 나무의 신령한 기운을 개도 알았는지 신통하게도 이 나무 아래에서는 절대로 똥을 싸지 않더군. 그뿐이 아냐. 이 산에 뱀이 많았지만 우리 은행나무 그늘에는 뱀이 다가오질 못 했어.”
가늠할 수 없이 긴 세월을 살아온 생명체 앞에서 과학의 잣대로 노인이 건네는 이야기의 진위를 따지는 건 애당초 옳지 않다. 나무 곁에서 30년 동안 나무를 바라보며 나무에 의지해 살아온 산골 농부의 나무 자랑이고 자연 사랑일 뿐이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은행나무인 삼척 늑구리 은행나무는 그렇게 과학 그 너머의 세계에서 죽음을 품고 살아가는 변증의 생명체로서 오랜 세월을 살았다. 나무의 유장한 생명력에 가만히 고개 숙일 따름이다.
글 사진 삼척 고규홍 나무칼럼니스트
gohkh@solsup.com


2012-07-19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