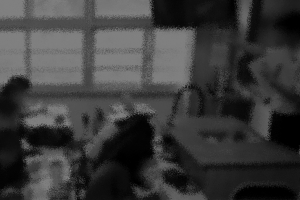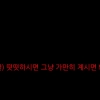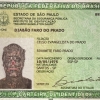【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 고정희 지음 나무도시 펴냄
버드나무는 땅이 끝나고 물이 시작되는 지점, 쉽게 말해 물과 뭍의 경계에서 잘 자라는 나무다. 여기서 ‘물가’는 종종 다른 세계, 예컨대 삶과 죽음의 세계가 교차하는 지점으로 읽히기도 한다. 이는 동서양이 비슷하다.조경학자 고정희가 지은 ‘식물, 세상의 은밀한 지배자’(나무도시 펴냄)에 따르면 유럽에서는 버드나무를 마녀들의 나무라고 부른다. 마녀들이 자신이 속한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가는 통로로 이용한다는 뜻에서다. 영화 해리 포터 시리즈의 채찍질하는 나무를 연상하면 알기 쉽다. 해리 포터 등 주인공들이 버드나무 둥치에 뚫려 있는 구멍을 통해 수없이 마을을 오갔던 장면 말이다.
우리나라에 전해 오는 버드나무 관련 이야기들도 대체로 ‘서늘한’ 편이다. 하룻밤 풋사랑을 기다리다 죽은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처녀 이야기가 그렇고, 고구려 시조 주몽의 아버지인 해모수를 사랑한 버들꽃 아가씨 ‘유화 부인’ 설화도 애절하다.
특히 이규보의 서사시 동명왕편에 등장하는 유화 부인 설화는 영국 웨일스 지방에 전해져 내려오는 케리드웬 여신의 이야기와 절묘하게 겹친다. 그뿐 아니다. 천안삼거리 능수버들 처녀 이야기는 보헤미아 지방의 젊은 부부 전설과 얼개가 놀랍도록 빼닮았다. 하나의 식물을 두고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구조의 이야기들이 전해져 오는 게 단순한 우연일까.
책은 이처럼 오랜 시간 인류와 함께한 식물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저자는 16세기에 이르러서야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낸 튤립부터 2억 7000만년 전에 지구상에 나타나 살아 있는 화석으로 불리는 은행나무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의 곁을 한결같이 지켜 온 식물들이 인류의 삶과 문화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살피고 있다. 수로 부인의 진달래와 마고 여신의 복숭아나무, 심청의 연꽃처럼 우리의 신화와 전설에 담겨 있는 식물은 물론 아담과 이브의 선악과라는 누명을 쓰게 된 사과나무와 비너스의 눈물이 변해서 생겨난 양귀비, 게르만 족에게서 거의 유일한 나무로 추앙받았던 마가목 등 서구 문화권에서 주목받았던 식물들이 책의 주인공이다.
저자는 헌화가와 함께 전해지는 수로 부인 설화에서 지중해의 플로라 여신이 떠오른다며 식물을 뿌리로 한 인류 문화의 유사성에 주목한다. 태초에 물과 연꽃만이 있었다는 이집트와 인도의 창조신화 또한 놀랍도록 닮아 있고 연꽃에서 솟아오르는 우리의 심청전 또한 재생설화란 측면에서 그와 맥을 같이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심청이 연꽃을 타고 지상으로 돌아온 까닭을 치유와 위로를 담당했던 신과 자연의 역할에서 찾으며 인류를 보살펴 온 식물의 넉넉한 품을 강조하는 저자의 분석이 인상적이다. 1만 6800원.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2-07-14 1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