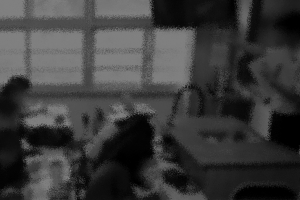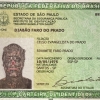【경성천도】도요카와 젠요 지음 다빈치북스펴냄
1931년 9월, 일본은 류타오후 사건을 빌미로 만주사변을 일으키며 만주의 대부분을 점령한다. 국제연맹은 곧바로 리턴조사단의 조사보고서를 채택, 일본의 만주 철수를 요구한다. 하지만 일본은 이를 묵살하고 1933년 국제연맹을 탈퇴한다.계속되는 국제연맹의 압박으로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고립되던 그해, 조선의 경성제국대학(현 서울대학교) 앞에는 ‘흥아(興亞)연구소’라는 특수 조직이 꾸려진다. 연구소의 수장 도요카와 젠요(豊川善曄)는 이곳에서 그동안 벼려왔던 ‘경성천도론’을 발간한다.
대동아공영을 위해 일본의 수도를 조선의 경성으로 옮겨 대륙 침략을 더욱 가열차게 벌여 나갈 것을 주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성천도’(김현경 옮김, 전경일 편역·감수, 다빈치북스 펴냄)는 도요카와의 주장을 그대로 우리말로 옮겨 놓은 책이다. 번역자들이 당시 시대 상황과 용어 해설 등을 상세하게 곁들여 독자의 이해를 도왔다.
도요카와는 책을 통해 “일본 번영의 지리적 이득을 위해서는 경성이 7할의 역할을 담당하고, 도쿄는 나머지 3할을 수행하는 방법밖에 없다.”며 “경성으로 제국의 수도를 옮기면 가만히 앉아서 일본과 만주의 통제공작에 화룡점정을 찍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800만명의 일본인을 조선으로, 조선인 800만명은 만주로 이주시켜야 한다고도 했다.
도요카와는 왜 도쿄가 제국의 수도로 적당하지 않다고 생각했을까. 그는 도쿄의 최대 결점이 “우리의 생명선인 조선·만주 대륙으로부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점”이라고 봤다. 두 지역을 병탄한 이상 도쿄가 접한 동쪽 바다보다는 서쪽 대륙이 중요한데, 도쿄는 이를 등지고 있는 형국이라는 것. 둘째는 지반이 약하다는 점이다.
그가 책을 쓰기로 마음먹은 주요한 계기도 1923년 9월 1일 발생한 간토 대지진이었다. 그는 “이 지진의 도시, 도쿄에 수도를 두는 것은 국가로서 크나큰 손실이라는 것을 느꼈다.”고 했다. 그러니 “나의 오랜 바람인 경성천도를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 것도 당연해 보인다. 아울러 도쿄가 해안에 위치한 탓에 방어적 지형을 갖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반면 경성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처졌고, 그 가운데로 한강이 흘러가는 천혜의 길지다. 그가 경성을 “흡사 이탈리아의 테베레 강변을 타고 영원한 수도라 불리던 로마를 방불케” 한다고 본 이유다. 무엇보다 지층이 안정돼 도쿄처럼 지진의 위험에 노출돼 있지 않았다.
최근 일본인들은 동일본 대지진을 겪었다. 가까운 시일 안에 도쿄에 수직직하형의 대지진을 겪을 수 있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80년 전 도요카와의 생각과 오늘날 일본인들의 생각은 얼마나 다를까. 1만 2800원.
손원천기자 angler@seoul.co.kr
2012-02-25 18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