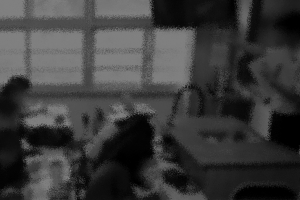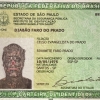국가가 ‘강탈’한 문화재 즐비…”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야”관리·도난 우려 내세우지만 속내는 ‘텅빈 박물관’ 우려
구미와 경계를 접한 김천의 고즈넉한 농촌 금오산 서쪽 남면 오봉리라는 마을 산기슭에 갈항사라는 사찰이 있다. 통일신라시대 이 근처에 있었다는 갈항사 이름을 딴 사찰이다.그 입구에는 보물 245호인 통일신라시대 오봉리 석조여래좌상을 안치한 문화재 보호각이 있고, 그 옆 노천에는 쇠창살로 보호각을 친 석조비로자나좌상이 있다. 이 비로자나상은 머리 부분은 없어진 듯 최근에 새로 만들어 붙인 불두(佛頭)를 올려놓았다. 몸체를 보면 여타 통일신라시대 말기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비로자나불상과 궤를 같이하므로 아마도 이 역시 같은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김천 갈항사지 동서 삼층석탑
경북 김천 남면 금오산 기슭의 갈항사 터에 있던 통일신라시대 동서 쌍탑. 일제시대 이래 서울로 옮겨 국립중앙박물관에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들 불상 옆 사과나무 과수원 밭 가운데에는 동·서 쌍탑이 있었다는 자리에 표지물이 있다. 그 표지판이 설명하는 문화재가 국보 99호인 ‘갈항사 삼층석탑(동·서)’이다. 이를 보면 이들 쌍탑은 신라 경덕왕 17년(758)에 건립됐다. 안내판에는 이런 문구가 보인다.
”원래 김천시 남면 오봉리 금오산 서쪽 기슭의 갈항사 터에 동·서로 세워져 있었으나, 1916년 2월12일 밤에 도굴배들이 사리장치를 훔쳐가려고 이 탑을 넘어뜨리는 사건이 발생하여 같은 6월에 양 석탑재를 수습하여 서울 경복궁 내로 옮겨가게 되었다.”
한데 도굴 피해를 본 석탑 더미를 해체하는 과정에서 도굴꾼들의 시도가 미수로 그친 사실이 드러났다. 사리공에서 사라장엄구를 발견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경복궁으로 옮겨간 갈항사 석탑은 어디로 가 있을까?
2005년 국립중앙박물관이 서울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이 석탑 또한 같이 옮겨가 지금은 그 야외에 다른 탑들과 함께 서 있다.
이 탑을 해체할 때 수습한 사리장엄구는 어디에 있을까?
국립대구박물관에 가 있다.
탑이 원래 있던 자리는 경북 김천에 있음에도, 제자리를 떠난 지 올해로 꼭 99년이 된 탑은 정작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대한민국 정부 소유물이 되어 서울에 있고, 더구나 그것이 천년 넘게 꽁꽁 보호하던 사리장엄구는 대구로 가 있는 기구한 운명이 계속되고 있다.
문화재는 제자리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당장 갈항사 석탑과 그 사리장엄구가 원래 있던 자리로 갈 수는 없다. 무엇보다 원래 자리가 사유지인 과수원 밭인 까닭에 이를 현지에서 보호하고 관리할 여건이 아직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더구나 그 관리 단체가 되어야 할 김천시에도 아직 시립박물관조차 없는 마당에 김천 어느 곳으로 덮어놓고 옮겨다 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렇지만 언젠가는 갈항사 탑이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는 당위성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문화재는 원래 자리에 있어야 빛을 발하기 때문이다.
갈항사 쌍탑이 서 있는 같은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전시실 한쪽에는 ‘영전사지 보제존자 사리탑’(令傳寺址普濟尊者舍利塔)이라는 이름이 붙은 고려 후기 승려 쌍탑이 있다. 보물 358호인 이 탑은 고려 후기 승려인 보제존자, 다시 말해 그 유명한 나옹화상(懶翁和尙)이 열반하자 그의 사리를 봉안한 곳으로 원래 자리는 강원도 원주시 복부면 태장1동 영천사(靈泉寺)라는 사찰에 있었다. 이 사찰은 다름 아닌 나옹화상이 창건했다.
이곳에 있던 그의 부도탑이 난데없이 서울로 오게 된 연원은 1915년 조선총독부가 개최한 조선물산공진회라는 행사에 있다. 요즘으로 보면 박람회에 해당하는 공진회를 개최하면서 그 볼거리를 위해 총독부는 각지에 있던 문화재를 징발해서 뽑아 올린다. 지금의 박물관 야외 전시실에 있는 석조문화재 상당수가 이때 제자리를 떠났다.
그때야 그럴 만한 곡절이나, 권력의 압력이 있어서 그랬겠지만 당연히 보제존자 쌍탑은 원래 자리를 찾아가야 한다. 하지만 이미 국가로 소유권이 넘어가 이를 관리하는 박물관은 내놓을 생각이 전연 없다.
서울 경복궁 경내 서남쪽 지금의 국립고궁박물관 앞뜰 은행나무 노거수가 짙은 녹음을 드리운 인근에는 국보 101호인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 현묘탑(法泉寺址智光國師玄妙塔)이 서 있다. 이 탑은 명칭으로 봐도 벌써 원래는 원주 법천사 터에 있던 지광국사라는 사람의 부도탑이다.
이 탑은 조선이 일본의 피식민지로 전락한 직후인 1912년 해체해서 일본 오사카로 반출됐다가 1915년 조선총독부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왔다. 하지만 법천사로 가지 못하고 경복궁으로 들어갔다. 그러다 한국전쟁 때 폭격으로 산산이 조각났다가 1957년 시멘트 땜질로 복원되어 오늘에 이른다.
탑은 현재도 해방과 더불어 총독부박물관을 대체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관리권이 이관됐으니 박물관이 용산으로 옮기고서도 여전히 국가 귀속 처리되어 관리권을 행사한다. 용산 이전 때 따라가지 못한 까닭은 워낙 수백 개 조각으로 깨진 것을 임시방편으로 붙여 세웠기 때문이라 그에 따른 훼손을 우려했기 때문이었다. 2일 현재 이 탑은 시멘트 땜질이 곳곳에서 떨어져 나간 상태다. 이에 문화재청은 이 탑에 대한 수리를 박물관에 요청했다.
하지만 더 심각한 문제가 남아있다. 이 탑이 가야 할 곳은 박물관이 아니라 원래 있던 자리라는 사실이다. 법천사 터 현장에는 이와 세트인 국보 59호 지광국사 현묘탑비(智光國師玄妙塔碑)가 지금도 그대로 서 있다. 탑비란 간단히 말해 비석이며, 그에 견주어 현묘탑이란 현묘라는 불교 승려의 사리를 안치한 부도(浮屠)이자 무덤이니, 이 둘이 세트이며, 그렇기 때문에 원래 있을 자리는 모두가 원주 법천사임은 말할 나위가 없다.

연합뉴스

원주에 있던 지광국사 현묘탑
원주 법천사지에 있던 고려초기 고승 지광국사의 부도탑. 일제시대 이래 서울로 와서 제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고 경복궁에 계속 서 있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이 탑이 있던 법천사 터 일대는 이미 2001년 이후 2003년에 걸친 발굴조사 결과 바닥 시설까지 찾아놓았다. 그 위치는 탑비 바로 앞이다. 원래 있던 자리까지 찾은 마당에, 더구나 그것과 세트인 탑비가 현장에 그대로 있는 마당에 그것이 현장에 가지 못할 이유가 없음에도, 여전히 국가(박물관)가 그것을 현지로 돌려줄 생각을 전연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제자리를 떠난 우리 안의 문화재가 부지기 숫자에 이른다. 국립중앙박물관과 산하 지방박물관이 국유물이라는 이름으로 볼모처럼 삼은 유물이 너무나 많다. 물론 개중에는 갈항사 석탑처럼 지금으로서는 현지로 돌아가기에는 당장 곤란한 문화재가 적지 않다. 하지만 지광국사 현묘탑이나 보제존자 탑처럼 지금 제자리를 찾아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문화재 또한 적지 않다. 이런 문화재를 ‘우리 안의 약탈 문화재’라 불러도 무방하다.
그렇다면 국립중앙박물관이 내세우는 논리는 무엇일까?
명목상은 언제나 “현지의 관리 준비가 되지 않았고 도난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는 말을 내세운다.
하지만 이는 명목일 뿐이면 속내는 따로 있다고 현지에서는 의심한다.
당장 지광국사 현묘탑만 해도 원주시 관계자는 “무단 반출되지 않았으면 6·25 때 폭격도 맞지 않았을 것이며, 더구나 서울의 오염된 공기에 항시 노출하는 것보다 법천사 터 현장에 두는 것이 보존환경에도 더욱 유리하다”면서 “혹자는 땜질 상태이기 때문에 현지로 옮기기는 곤란하다고 하지만, 요즘 과학기술 수준에서 못 옮길 문화재가 어디 있느냐”고 반문한다.
이처럼 중앙정부가 문화재를 독점하는 바람에 정작 그것이 있어야 할 지방에서는 공동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지방자치제가 서서히 착근하기 시작하면서 각 지자체에서도 박물관을 잇달아 세우고 있지만, 그것을 채울 주요한 유물은 국가가 독점한 채 내어주지를 않기 때문에 모조품으로 대체하는가 하면, 수집이 가장 쉬운 민속유물로 채우는 일이 많아 “모든 지방박물관은 민속박물관”이라는 한탄도 나오고 있다.
강원도 지역 한 문화계 인사는 “이런 판국에 과연 우리가 외국에 대해 우리의 문화재가 약탈당했다고 돌려달라고 할 명분이나 있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 “국가는 무단으로 점유한 지방문화재를 현지로 돌려주어야 하며, 국립박물관이 앞으로 할 일은 유물의 독점적 관리가 아니라 문화재의 체계적인 활용을 위한 전시를 기획한다든가 지방박물관을 지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