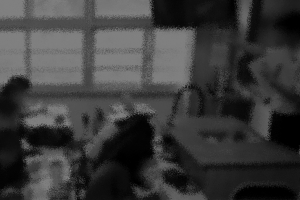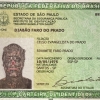학고재갤러리 ‘디자인의 덕목’전
더하기보다는 빼기다. 모든 것을 버리고 버린 채 최소한의 것만 남기기. 그게 디자인의 묘미다. 여기다 한가지 요건이 더해진다. 예술을 하려 들지 말 것. 예술은 의식적으로 인간에게 불편함을 불러일으키려 드는 데 반해, 디자인의 핵심은 실용성이다. 그래서 자의식이나 개념 같은 생각마저 버려야 한다.
학고재갤러리 제공

네덜란드 작가 헬라 용에리위스(49)의 작품 비드 벌브(Bead Bulb).
학고재갤러리 제공
학고재갤러리 제공
붉은 탁자로 유명한 마르텡 세글리, 화려한 외양보다 작품이 이야기를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피에르 샤르팽, 비례와 변형의 기하학적 구조를 강조한 제임스 얼바인 같은 디자이너들은 가장 기본적인 구조만 쓰되 이를 어떻게 쌓아나가는가에 따라 어떤 미감이 생길 수 있는지 선보였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이 직선적이고 건조하다면, 입체감을 강조해 공예적 성향이 강한 헬라 용에리위스, 간결한 형태에다 부드럽게 물결치는 선들을 강조한 로낭과 에르완 부훌렉 형제 같은 이들의 작품은 시각의 긴장감을 풀어헤쳐 준다.
그냥 이들 현대적 디자인 작품만 모아둔 것은 아니다. 강화반닫이 같은 한국의 전통 고가구와 이우환, 프랑수아 모렐레 같은 작가들의 모노크롬풍 미술 작품들도 함께 선보인다. 엄격한 절제미라는 점에서 상통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가장 강렬한 파격은 추사 김정희의 봉은사 판전 현판의 탁본을 입구에다 전시해뒀다는 점이다. 이 글씨는 추사의 말년 걸작으로 일컬어지는 작품으로, 기교 없이 굵은 필획으로 쓴 것이 마치 조선 백자의 순박한 미감을 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대 디자인의 미감을 이미 추사가 선취한 게 아니냐는 질문이다. (02)720-1524.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2012-02-25 1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