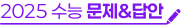읽어야지 하면서 계속 미뤄 왔던 책을 지난 주말 집어들었다. 이영미의 ‘누울래? 일어날래? 괜찮아? 밥 먹자’였다. 책을 디자인하는 저자가 50대 후반인 2016년 루게릭병을 진단받고 혼자 힘으로 글을 쓸 수 있었던 2018년 8월까지 페이스북과 메모장에 쓴 글을 엮었다.
이 책의 서평과 지인들의 추천글도 많았지만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았다. “병과 싸운 기록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기”라는 시인 최영미의 글이 아니더라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가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통을 덤덤하게 마주하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수없이 물었다. 책을 덮으며 건강도 가족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다짐하지만 뒤돌아서면 잊는다.
문득 작년에 정말 힘들게 읽었던 박희병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구순의 어머니를 1년 동안 간병하며 쓴 기록인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다. 당시 느꼈던 먹먹함이 오롯이 되살아났다. 콧등이 시큰해진다. 그때도 부모님과 시어머니, 가족들에게 매순간 진심을 다해야지 다짐했는데….
후회라는 병이 도졌다. 그래도 잊을 만하면, 무감각해지려 하면 맞닥뜨리는 자극에 감사하며 나를 돌아본다.
이 책의 서평과 지인들의 추천글도 많았지만 여러 번 들었다 놨다 했다. 읽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많이 힘들 것 같았다. “병과 싸운 기록이 아니라 삶을 다시 바라보는 일기”라는 시인 최영미의 글이 아니더라도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어 가면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고통을 덤덤하게 마주하고 매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 수없이 물었다. 책을 덮으며 건강도 가족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 다짐하지만 뒤돌아서면 잊는다.
문득 작년에 정말 힘들게 읽었던 박희병 서울대 국문학과 교수가 구순의 어머니를 1년 동안 간병하며 쓴 기록인 ‘엄마의 마지막 말들’이 떠올랐다. 당시 느꼈던 먹먹함이 오롯이 되살아났다. 콧등이 시큰해진다. 그때도 부모님과 시어머니, 가족들에게 매순간 진심을 다해야지 다짐했는데….
후회라는 병이 도졌다. 그래도 잊을 만하면, 무감각해지려 하면 맞닥뜨리는 자극에 감사하며 나를 돌아본다.
2021-10-01 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