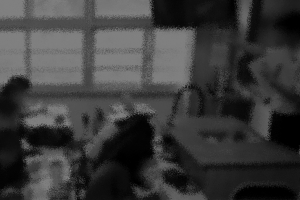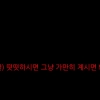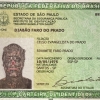정부와 새누리당이 여론의 반발로 무산됐던 소규모 학교의 통폐합을 재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해 추진했던 통폐합안에 명기했던 초등·중학교 6학급 이상, 고교 9학급 이상 등의 획일적인 기준을 뺐지만 학교당 재정 인센티브를 대폭 늘리는 등 기준을 유연하게 잡았다. 이는 초·중등 교육정책을 지역 거점학교 육성 쪽으로 방향을 튼 것으로, 큰 틀에서는 옳다고 본다.
통폐합 안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유지비를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년당 학생수가 5~6명인 곳이 많고, 일부 교과과정의 경우 복식수업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1462개, 중학교 470개, 고등학교 52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농어촌 교육정책은 농어촌 활성화 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 지역민과 학부모들은 통폐합 작업이 지역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 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교의 경우, 기숙형 학교를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지역 특성을 살린 기숙형 학교의 성공 사례는 적지 않고, 외부 학생의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다.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과 깊이 연관돼 있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90%가 농촌에 있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학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중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의 통학 문제는 접근성 문제로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198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500여개 학교가 통폐합됐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한 채 방치된 폐교가 부지기수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교육 당국은 통폐합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과 함께 대안들을 면밀히 찾아 나가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통폐합 안은 학생수가 줄어드는 도서·벽지 소규모 학교의 열악한 학습 여건을 개선하고 유지비를 효율화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 교육 당국은 학년당 학생수가 5~6명인 곳이 많고, 일부 교과과정의 경우 복식수업으로 인해 교육 여건이 열악하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전국에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초등학교 1462개, 중학교 470개, 고등학교 52개에 이른다. 대부분이 농어촌 지역에 있다. 농어촌 교육정책은 농어촌 활성화 정책과 상치되는 측면이 있어 선택이 쉽지 않다. 지역민과 학부모들은 통폐합 작업이 지역의 경제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일부에선 소규모 학교의 장점을 살려 특성화 학교로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중·고교의 경우, 기숙형 학교를 대안으로 삼을 만하다. 지역 특성을 살린 기숙형 학교의 성공 사례는 적지 않고, 외부 학생의 유입 등으로 지역사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제는 초등학교다. 초등학교는 지역 주민의 삶의 터전과 깊이 연관돼 있다. 100명 이하 소규모 학교의 90%가 농촌에 있어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 공동체가 무너지고 삶의 공간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 오지가 많은 강원도의 경우 절반 이상이 학교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중학생과 달리 초등학생의 통학 문제는 접근성 문제로 학부모들이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다. 또한 198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500여개 학교가 통폐합됐지만 활용을 제대로 못한 채 방치된 폐교가 부지기수다. 지방자치단체와 학부모, 지역민의 의견 수렴이 선행돼야 하는 이유다. 교육 당국은 통폐합 이후에 나타날 문제점과 함께 대안들을 면밀히 찾아 나가야 반발을 줄일 수 있다.
2013-08-06 27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