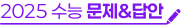김택규 번역가
이 정도면 지금은 웹소설의 황금기가 아닐까. 더욱이 고도의 전문성과 큰 자본이 요구되는 웹툰 창작과 달리 웹소설 창작은 문턱이 낮다. 누구든 다년간의 고된 습작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특정 문예 학과와 매체의 문화자본 없이도 수백만 명의 독자를 갖춘 대형 플랫폼에 자유롭게 작품을 발표할 수 있다. 그리고 매편 수만 회의 조회 수를 기록하면 매달 수천만원씩 인세를 받으며 부와 명예를 누릴 수도 있다. 자, 이 정도면 웹소설의 황금기를 넘어 문학의 황금기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단군 이래 이 정도로 작가와 독자의 저변이 무한 확대된 시대가 있었던가.
그런데 이 ‘문학의 황금기’는 조금 이상하다. 웹소설은 활황인데 종이책 소설은 초판 인쇄 부수가 1000부 이하로 쪼그라들었고 이것조차 다 팔리는 경우가 드물다. 인기 웹소설 작가는 매달 인세가 수천만원이라는데 종이책 소설 작가는 강연이나 글쓰기 강좌로 입에 풀칠을 하고 코로나19 시대가 와서는 그것조차 힘들어져 청소 아르바이트를 한다. 그리고 웹소설 독자는 수백만 명에 달해 지하철에서도 시간을 쪼개 휴대폰을 들여다보는 이들이 숱한데, 순문학 소설과 시를 읽는 사람은 계속 줄어들기만 한다. 도대체 이 모순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아마도 ‘문학’이라는 개념의 오랜 지체 현상 때문이 아닌가 싶다.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문학’은 ‘사상이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한 예술’이고 나아가 자본주의 시대의 주요 장르인 ‘소설’은 ‘사실이나 작가의 상상력을 바탕으로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표현하는 허구적 이야기’이지만, 웹소설은 굳이 ‘예술’이 되려는 의도가 없으며 ‘인간의 모습이나 사회상’을 일부 표현하기는 하되 그것은 사실성이나 당위성이 아닌 순수한 ‘오락성’에 복무한다.
오래전에 “책 몇 권 냈다고 작가 흉내내는 녀석들은 딱 질색이야”라는 말을 웹소설 작가 형에게서 들은 적이 있다. 웹소설에서는 로맨스, 판타지, 무협 등 장르마다 반드시 지켜야 하는 스테레오타입이 있다. 그런데 데뷔 후 얼마 안 돼서 성취감에 빠진 나머지 스테레오타입에서 벗어나 과감히 일반 소설의 복잡하고 심층적인 양식을 도입하는 웹소설 작가들이 있었다.
작가 형은 그런 시도를 혐오했다. “잘난 척하려고 재미를 버린다”고 보았다. 일리가 없지는 않았다. 사실 그 작가들은 대부분 제도권 문예학과 출신으로서 기존 ‘문학’을 선망해 그런 ‘신선한’ 시도를 했지만 독자에게 거의 외면당하고 말았다. 웹소설 작가에게 ‘작가다운’ 것은 미덕이 아닌 것이다.
“이건 소설이 아니라 예능이라니까요”는 웹소설 작가 동생에게서 들은 웹소설의 정의다. 웹소설은 5000~6000자 분량의 연재물 수백 회로 구성되며, 몇 달간 주당 평균 5회씩 연재된다. 웹소설 작가는 처음에 대체적인 스토리 구성만 한 상태에서 매일 ‘달린다’. 한 달에 1권 분량을, 시시각각 댓글로 달리는 독자들의 반응을 반영하며 미친 듯이 써 내려간다. 문학 작품은 곧 작가의 통일적이고 개성적인 세계라는 모더니즘의 작품관과는 완전히 동떨어져 있다. 웹소설 독자는 이렇게 예능이나 드라마의 시청자처럼 작품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며 더욱이 지루하고 밋밋한 전개는 단 몇 문단도 못 견딘다.
이처럼 웹소설의 작가와 독자는 우리가 아는 문학의 작가와 독자가 아니고, 나아가 그 작가와 독자 간 상호소통의 산물인 웹소설도 우리가 아는 문학이 아니기에 ‘웹소설의 황금기’가 곧 ‘문학의 황금기’는 아님이 자명해졌다. 하지만 이는 명명과 범주화의 문화권력이 아직은 현 제도권에 있기에 그러할 뿐이다. 혹시 근미래에 그 문화권력이 ‘웹콘텐츠’ 영역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아예 ‘종이책’이라는 소설의 매체가 유명무실해진다면 어떻게 될까.
2021-02-25 30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