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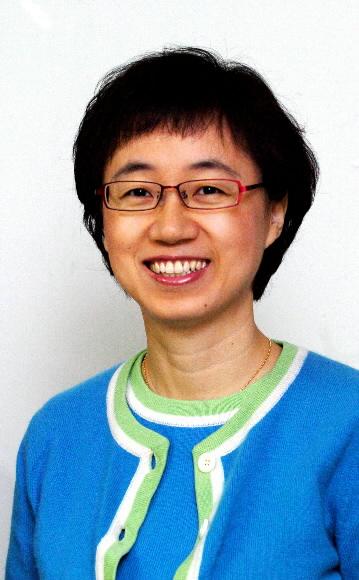
최광숙 논설위원
우리는 어떤가. 몇 차례의 혼선 끝에 발표한 세월호의 탑승자 476명도 또다시 번복될 수 있다고 한다. 신원을 밝히지 않고 탄 무기명 승선표가 37장이나 발견됐기 때문이다. 만에 하나 실종자들의 신원들이 끝내 밝혀지지 않는다면 탑승자의 정확한 숫자는 ‘신’의 영역으로 남을지도 모르겠다.
세월호 참사가 우리를 더욱 비참하게 만드는 것은 사고 수습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의 무능함이다.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세월호 선원들이나 이 나라 관료들이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 위기 상황에서 우왕좌왕한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나 기초적인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아직까지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모습이 뭐가 다른가.
재난 대책을 총지휘할 수장이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것을 보면 이 나라는 정녕 무질서와 혼돈 속 무정부의 나라와 같다. 위기 상황에서 제 잇속(뱃속) 챙기는 것도 비슷하다. 승객보다 내 살길이 먼저라고 제일 먼저 배에서 탈출한 선원들이나 꽃다운 어린 학생들의 죽음 앞에 무슨 면목이 있다고 쭈그리고 앉아 컵라면을 먹는 장관이나 국민들 눈에는 ‘그 나물에 그 밥’이다.
자기들끼리는 무전기로 연락을 취하며 탈출한 선원들의 끈끈한(?) 의리를 보면 ‘해피아’(해양수산부 마피아)니 뭐니 하는 공직자들의 내 식구 챙기기가 생각난다. 만약 고장 난 조타기를 알고도 선원들이 배를 몰았다면 정책의 문제점을 알고도 내 임기 동안 사고만 나지 않으면 된다고 덮어버리는 공무원들의 행태나 마찬가지다. 선장은 자신이 배를 몰았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항해사에 책임을 전가하고, 이 정부도 뱃사람들을 탓한다. 내 탓은 없고 네 탓만 난무한다.
이런저런 안전 규정을 무시해 수많은 이들의 목숨을 앗아가도록 바다를 무법천지로 만든 것은 세월호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들을 감시·감독해야 할 권한을 갖고도 뒷짐 진 정부 관련자들에게 더 큰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바뀐다.
bori@seoul.co.kr
2014-04-25 31면


































